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쓴 사람도 저작권 무단 이용에 해당하므로, 원래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 회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A 회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해 사립 C 대학 등에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 대학은 이렇게 얻은 소스코드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고 2016년에는 B 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을 넘겼다. 이후 저작권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안 A 사는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B 씨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B 씨가 평생교육원을 포괄 인수했으므로 2014~2015년 C 대학의 잘못으로 생긴 부당이득을 A 사에 돌려줄 책임이 있지만, 2016년 이후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부당이익을 본 사람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민법은 이런 경우 부당이득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구별한다. 자신이 부당이득을 보고 있음을 안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 전체의 반환 책임이 있고, 모르고 부당이득을 본 ‘선의의 수익자’는 남은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2심은 저작권을 ‘알고도’ 침해한 C 대학(악의의 수익자)과 달리 저작권 무단 이용 경위를 몰랐던 B 씨(선의의 수익자)가 2016년 이후 강의 콘텐츠로 남긴 이익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건 A 사에 있고, A 사가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했으므로 B 씨가 돌려줄 부당이득은 2014~2015년분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2016년 이후의 강의 콘텐츠 무단 이용 부분도 책임져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저작권을 무단 이용했다면 부당이득이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B 씨가 저작권 문제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 사가 입은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B 씨가 강의 콘텐츠로 아무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영업이익 상당의 현존 이익이 있다고 추정해야 하고,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단독] 삼성전자, AI 챗봇 서비스 ‘나노아’ 본격 적용…“생성형 AI 전방위 확대”](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069.jpg)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https://img.etoday.co.kr/crop/140/88/19744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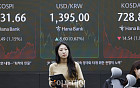
![점점 오르는 결혼식 '축의금'…얼마가 적당할까?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166.jpg)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745.jpg)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567.jpg)















![점점 오르는 결혼식 '축의금'…얼마가 적당할까?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1166.jpg)
![주한일본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11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