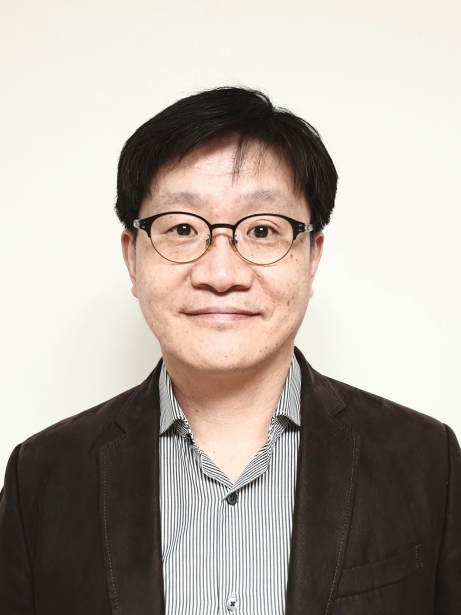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며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함께 근무하는 기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기업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문턱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 직장 동료가 얼마나 있을까.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따르면, 국가ㆍ지자체ㆍ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적용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 직원 100명 중 적어도 4명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43.5%에 그친다. 의무 사업체 절반 이상이 3~4%를 채우기보다 미이행 부담금을 내고 만다. 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다. 장애인의 취업상 지위도 불안정하다. 상용근로자는 39.5%뿐, 나머지는 임시·일용직(30%)이거나 비임금근로자(30.4%)다. 이마저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일자리가 상당수인 실정이다.
심지어 중증 장애인은 ‘근로 능력’을 부족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용구 소장은 “근로 능력의 부족을 정의하기 위한 평가 및 결정 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이로 인해 다수 장애인 특히,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인-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뿐더러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주로 근무하는 보호 작업장 역시 열악한 곳이 상당수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격리된 상태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최근 시장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에 장애인 고용 확대에도 나서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그 역시 이런 변화를 반겼다. 그는 “어떤 책임이든지 막상 실천하려고 할 때 귀찮고 힘이 든다. 때로는 의도에 대한 오해도 부를 수도, 비용이 들 때도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ESG 경영 관점에서 이런 노력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며 “그 투자가 시장 약자를 향한다면 우리는 더 따듯한 자본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선 다양한 직무 개발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소장은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취업알선 서비스 그리고 직업 훈련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더 나아가 자영업, 창업 기회 역시 필요하다”며 “장애인은 노동권을 보장받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역시 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의 ESG 거버넌스가 맞물릴 때, 사회는 장애인들의 진입을 막는 노동시장 문턱을 함께 부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515.jpg)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156.jpg)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671.jpg)










![[종합] 한화생명, 3분기 누적 순익 7270억…전년比 13.9% ↓](https://img.etoday.co.kr/crop/85/60/2093472.jpg)
![[노트북 너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101528.jpg)
![[종합]‘불났다 하면 잿더미’ 꺼렸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된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101738.jpg)
![[종합] 메리츠금융 "PER 10배 되면 현금배당 더 커질 것"](https://img.etoday.co.kr/crop/85/60/2064322.jpg)


![[종합] 메리츠화재 "계리적 가정 최선추정 원칙에 부합…CSM 변화 없어"](https://img.etoday.co.kr/crop/85/60/2101740.jpg)


![[정치대학] 박성민 "尹대통령, 권위와 신뢰 잃었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1600.jpg)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첫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17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