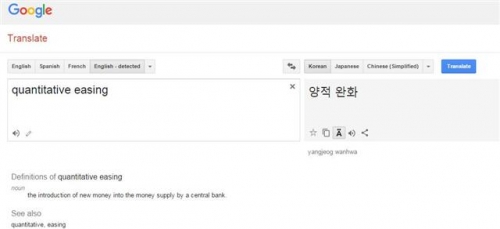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흥미로운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계 번역의 발달로 앞으로 10년 안에 언어장벽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외여행을 할 때는 항상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사전이나 회화책이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힘들게 말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꺼내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순식간에 90개 언어 중 하나로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 대목은 WSJ가 다소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구글 번역기를 작동시켜 영어로 된 신문기사를 한글로 바꿔보면 도무지 뜻이 통하지 않아 여전히 원문을 보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딥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컴퓨터의 놀라울만큼 막대한 정보 처리 속도, 데이터 축적 정도를 감안하면 컴퓨터 번역과 통역이 인간을 대체할 날도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각종 번역 기계들이 2억여 명의 사람을 위해 매일 10억회 이상의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어순과 단어 등이 비슷한 언어 간의 번역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살펴보면 특정 고유명사나 일부 동사를 제외하면 얼추 80% 정도는 뜻이 통하네요. 아마 WSJ도 영어와 스페인어, 또는 독일어 등에서 기계 번역 성과를 보고 이런 기사를 내지는 않았을까요.
한국어와 영어처럼 가장 상호 번역이 어려운 언어 사이에서도 한국어ㆍ일본어 수준으로 번역이 이뤄지거나 IT와 경제 등 전문 분야에서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매끄러운 번역 결과가 나온다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WSJ는 작은 이어폰을 장착하면 상대방에게 외국어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거나 맞은편에서 말하는 것을 거의 동시에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업가가 브라질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인과 대화를 할 때 둘 다 서투른 영어를 써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갈 필요도 없고 비영어권의 많은 사람도 해외 비즈니스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화를 인식해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도 현재 개발 중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가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요. 하다못해 필자와 같은 국제부 기자라면 당장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영어 사교육 시장도 급격히 줄어들겠지요. 대학 어문학 전공도 아예 폐지되거나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토익 압박에서 벗어나 다른 전문적 지식을 쌓는 일에 몰두하는 등 순기능도 있겠네요. 정말 실력이 있고 전문성을 띤 어학 능력자라면 더 각광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이런 전문가들을 고용해 자신의 플랫폼을 더욱 가다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구글이 엄청난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구글이 가진 셈이니까요.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644.jpg)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528.jpg)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0.jpg)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256.jpg)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63.jpg)






![[1보] 국제유가, 급락...WTI 3.3%↓](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741.jpg)

![[아시아증시]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항셍지수 1.7%↓](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674.jpg)
![[종합] 이시바 일본 총리, 재선출 됐지만...여소야대 정국·트럼프 대처 등 과제 산적](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683.jpg)
![[상보] 일본 이시바, 중의원 결선투표 끝에 총리 재선출](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667.jpg)




![[찐코노미] "한국은 이것 가능한 유일무이한 국가"…방산주 '이렇게' 투자할 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0715.jpg)
![코스피 1% 이상 하락... 2531.66에 마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06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