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과 우리나라의 외주 제작제도는 방송법에 따른 의무편성비율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낸다. 영국의 경우 매체 구분없이 의무편성비율 25%만 준수하면 되지만, 우리는 35%(MBC, SBS), 40%(KBS 2TV) 25%(KBS 1TV) 등으로 비율을 달리하면서 외주제작에 높은 의존도를 드러낸다. 더불어 영국은 특수 관계자 제작 비율(국내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20%)의 규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인데다 계열 프로덕션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자체 제작으로 취급해 외주제작사의 콘텐츠 독립성을 보장해준다. 또, 영국 공영방송 시스템은 CH4, CH5라는 외주전문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독립제작사 간의 콘텐츠 경쟁이 가능하다.
제작환경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외주사가 스튜디오, 제작인력, 장비 등을 스스로 해결하지만 우리나라 외주사는 작가만 확보한 상태에서 스튜디오, PD, 촬영 인력, 편집실, 방송장비 등 대부분 제작요소를 방송사에 의존한다. 이에 제작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방송사가 직접제작비의 약 45%에 해당되는 간접비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는 장르별, 시간대별 표준 제작비가 정해져 있어 콘텐츠 제작의 리스크가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한 출연료와 작가료로 인해 위험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는 결과적으로 열악하고 척박한 제작환경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편성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지만, 실제 방송사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비율은 약 70~80% 정도다. 문제는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여부다. 업계 관계자들은 약 70~80%에 달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 제작사가 콘텐츠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는 고작 1~2곳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태생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국장은 “영국의 제도 시스템은 앞서 있다. 롤모델로 봐야한다. 드라마 제작사가 방송사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며 “국내 외주 제작 시스템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제작주체의 다원화만 있었을 뿐 성장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한다. 제작사들의 콘텐츠 권리 보장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 민영동 대외협력부장은 “기본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다. 시청자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정책 목표 설정하에 외주제작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면서 “영국에서는 의무쿼터가 생기기 전에 외주전문채널인 채널4가 먼저 생겼고, 탈런던 정책을 통해 지역제작사도 육성하고 있다. 선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에 다양한 콘텐츠 발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과장은 “외주제도를 도입하면서 양적으로는 성장을 거뒀다. 외주제작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외주물도 크게 증가했다”며 “외주제작물의 질적인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외주제작사의 현실도 매우 열악한 것도 현실이다. 이런 독립제작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단독] 삼성전자, AI 챗봇 서비스 ‘나노아’ 본격 적용…“생성형 AI 전방위 확대”](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069.jpg)
![김호중ㆍ황영웅 못 봤나…더는 안 먹히는 '갱생 서사', 백종원은 다를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17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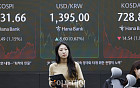
![점점 오르는 결혼식 '축의금'…얼마가 적당할까?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166.jpg)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745.jpg)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567.jpg)














![과잠이 늘어진 동덕여대·성신여대 시위 현장 모습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101122.jpg)
![[정치대학] 尹대통령, 최저 지지율로 임기 반환점…결정적 패착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1165.jpg)
![2500선 내준 코스피, 1400원 넘어선 환율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12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