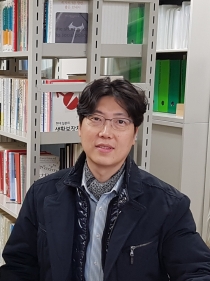
이 일화는 지난 30여 년간 발전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크게 바뀌어 왔음을 보여준다. 흔히 빈곤이라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를 떠올리게 되지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두 기둥 위에 복지국가라는 지붕을 얹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절대적 빈곤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덕분에 지난 10년간 노인자살률도 점차 감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간해서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빈곤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는 편이다. 먼저 절대적 빈곤은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19세기 영국의 시봄 라운트리(Seebohm Rowntree)는 인간의 신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얻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식료품비를 구하고, 여기에 피복비와 연료비 등을 더하여 빈곤선을 산출한 바 있다.
이러한 라운트리 방식은 과학적인 빈곤선 계측방법으로 각광받았다.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된 최저생계비 역시 라운트리 방식을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비 품목들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품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식료품비 산출에 고기를 넣어야 할까? 지금은 당연하겠지만 30~4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고기를 넣는다 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나 닭고기만 반영하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돼지고기는 부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품목 하나하나가 복잡한 논의 대상이다.
다른 예로 휴대폰 요금을 생각해보자. 휴대폰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요즘 같아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휴대폰 요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선을 설정할 때 한 사회의 통상적인 소비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에 근거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영국의 사회정책학자 피터 타운젠드(Peter Townsend)는 당시의 통상적인 삶의 수준을 반영한 12개의 박탈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단지 소득이 얼마라는 기준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빈곤 현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자면, 1주일에 신선한 고기(육가공품을 제외한)를 4번 이상 먹지 못한 인구의 비율이 19.3%, 지난 1년 동안 집을 떠나 휴가를 즐기지 못한 인구의 비율이 53.6%에 달한다는 식이었다. 타운젠드의 사회조사가 1960년대 후반에 진행된 것이었으니, 서양 사람들이 거의 매일 고기를 먹는다는 중학교 때 선생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닌 셈이다.
2015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혜택의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집에서 높은 집까지 일렬로 세운다고 가정할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중위소득도 상승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의 변화를 곧바로 복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올해의 기준중위소득은 산정 자료원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나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이 상대적 빈곤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변화들이다.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644.jpg)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528.jpg)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0.jpg)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256.jpg)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63.jpg)





!["한국은 '이것' 가능한 유일무이한 국가" 방산주 '이렇게' 투자할 때입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9X9jpK5FGE/mqdefault.jpg)




![[시론] 연장근로 임금산정과 처벌기준 구별 유의를](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731.jpg)
![[마음상담소] 내면의 힘 기르는 ‘세 줄 일기’](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724.jpg)
![[과학세상] 반도체 경쟁력, 인재 확보에 달렸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719.jpg)
![[논현로] 트럼프 2기, 중국과의 디커플링 속도 빨라질 듯](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714.jpg)
![[찐코노미] "한국은 이것 가능한 유일무이한 국가"…방산주 '이렇게' 투자할 때](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715.jpg)
![[찐코노미] "한국은 이것 가능한 유일무이한 국가"…방산주 '이렇게' 투자할 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0715.jpg)
![코스피 1% 이상 하락... 2531.66에 마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06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