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돼도 업무역량보다 인간관계…인사고과 밀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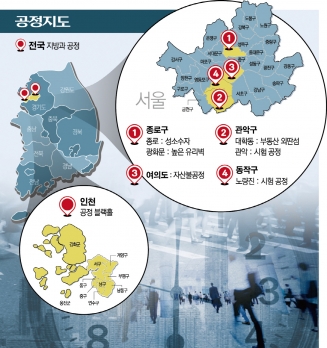
“나는 기업에서 건전지 같은 존재다. 리모컨 작동이 안 되면 사람들 대부분은 건전지를 교체하려고 한다. 리모컨이 망가졌을 수 있는데 말이다.”
한 중견기업 총무팀에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으로 합격했을 때만 해도 박현석(28·남·가명) 씨는 희망에 부풀었다. ‘열심히 일하면 몇 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는 건 자신이 ‘부품’에 불과하다는 자괴감뿐이다.
입사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박 씨는 아직도 정규직 전환기준을 모른다. 역량과 행동거지를 평가한다고는 하나, 평가 결과가 공정할 것이란 믿음은 없다. 선배들에게 듣는 말이라곤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하니 어떻게 노력해 보라’는 조언이 아닌 “몰래 다른 회사에 지원하기만 해봐라”는 식의 협박이다. 기약도 없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저임금에 청년들을 부품처럼 쓰다 버리는 게 장 씨가 생각하는 인턴제도다. 경쟁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김태웅(30·남·가명) 씨는 지난해 두 차례 대기업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그는 반복되는 채용 실패로 사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다.
김 씨는 인턴으로 근무할 때 실무역량평가에서 동기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합격자는 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동기였다. 그는 “인턴에 참여한 두 기업에선 학연, 지연, 혈연 등도 평가요소에 넣었다”고 말했다. 객관적 능력보단 ‘후광효과’가 당락을 갈랐을 것이란 얘기다. 마지막 인턴 후 정규직에서 탈락했을 때 김 씨의 머릿속엔 ‘허탈하다’는 네 글자뿐이었다.
인턴 탈락의 후유증은 크다.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동안 몸도, 마음도 병든다. 인턴 탈락이 반복될수록 늘어나는 나이는 덤이다. 더 큰 문제는 다음이다. 인턴 경험은 이력서에 넣지도 못한다. 다른 인턴들과 경쟁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된다면 상황은 나아질까. 채용 과정부터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외침은 인사 후에도 이어졌다.
A백화점 영업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유진(33·여·가명) 씨는 입사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만년 대리’다. 그가 ‘탈(脫)대리’를 못 하는 건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출근해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인사고과를 받았다.
최 씨는 “인사평가가 업무 역량보다 사내 정치를 잘하느냐가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술을 즐기지 않고 사내 정치에 동참하지 않는 그는 항상 고과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반면, 재택근무를 병행한 1년 선배는 고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최근 승진한 팀장 줄을 잘 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흔히 말하는 ‘내 사람 챙기기’가 많이 작용한 탓”이라고 말했다.
기준이 모호한 인사고과는 최 씨에게 일할 동기를 잃게 했다. 기업의 핵심 인재가 되자는 입사 초 각오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은 가늘더라도 직장에 오래 붙어 있자는 생각뿐이다. 최 씨가 생각하는 불공정의 핵심은 개인의 업무 역량보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제도다. 평가 주체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다 보니,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최 씨는 “벌써 몇 년째 ‘승진’이라는 희망고문에 속고만 있는 내가 안쓰럽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프로세스가 아닌, 업무 성과를 공정하게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2.jpg)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0.jpg)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256.jpg)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63.jpg)

















![[정치대학]이재명, 정치운명 가를 ‘운명의 주’…시나리오별 파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0294.jpg)
![하나금융그룹, '모두하나데이' 소외계층에 김장김치 1만1111포기 전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047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