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기말(世紀末): 한 세기의 끝. 혹은 사회의 몰락으로 사상이나 도덕, 질서 따위가 혼란에 빠지고 퇴폐적, 향락적인 분위기로 되는 시기.
때는 1997~1999년 경. 100년을 의미하는 ‘한 세기’의 말이 아니라, 제2천년기(밀레니엄, millennium)를 끝내고 제3천년기라는 새 시대에 들어서는, 정말이지 천 년에 한 번 밖에 볼 수 있는 뜻 깊었던 세기말.
우리가 그간 구축해온 모든 전산체계를 Y2K 문제가 일거에 파괴시키는 것 아닐까? 노스트라다무스도 1999 일곱째 달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예언했다던데! 혹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의 때도 2000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2000년 1월 1일을 무탈하게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불안감과 설렘을 한껏!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그 시절 기업들의 ‘세기말 마케팅’을 한 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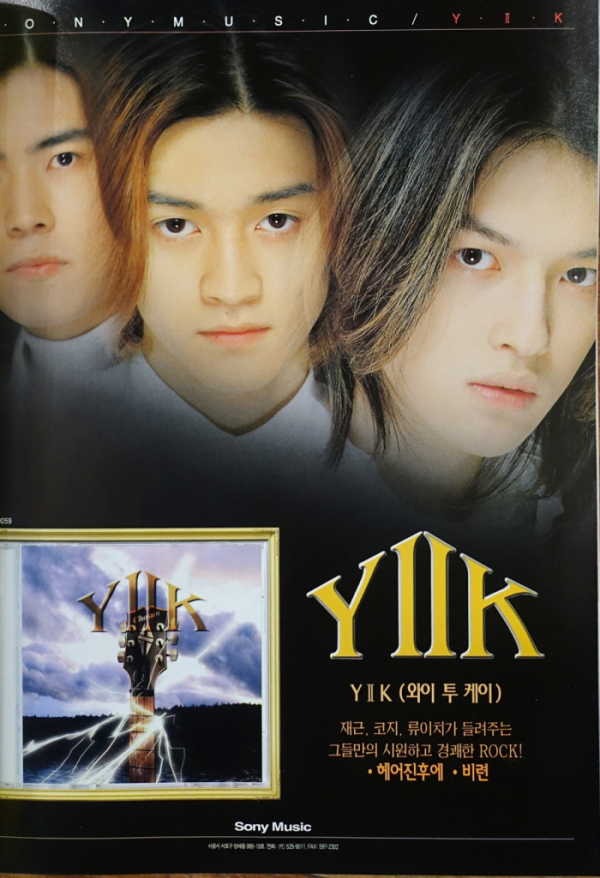
◇Y2K의 공포 앞에서
Y2K. 'k'는 1000단위를 의미하는 킬로(Kilo)의 약자이므로 Y2K는 'Year 2000'이라는 뜻이다. 흔히 Y2K라고 줄여 부르던 ‘2000년 문제’에 대해 당시 전 세계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공포까지 만연한 분위기였다.
2000년 문제 중 하나는 전산체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다. 당시 기술상의 한계와 멀리 내다보지 못한 안일함이 맞물리며 대부분의 컴퓨터가 ‘19○○년 ○○월 ○○일’이라는 형태로 시간을 인식하게끔 설계되어 있었다. 이런 전산체계는 1999년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2000년이 되는 순간 컴퓨터가 시간을 1900년으로 인식하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예측이었다.
이는 이 시점에 이미 전산화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던 과세, 금융, 정부, 기업 등 현존 전산 시스템 모두가 일거에 마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당대 최고의 화두였다.
앞서 말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원래 인류사에서 세기말에는 늘 종말론적 정서가 감돌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인지 무엇인가 이 세계의 것이 아닌 듯한 현 세대를 초월한 희한한 무엇인가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는 업체들이 많았다.

세기말의 평범한 노래방이다. 무슨 콘셉트인지... 말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보면 느낌이 팍 올 것같다. 홍보 문구에는 그 당시에 정말 잘 쓰였고, 또 잘 먹혔던 세 가지 마법의 단어, ‘21세기’, ‘사이버’, ‘테크노’가 모조리 들어 있다.
만약 지금 이런 콘셉트로 노래방을 창업한다면, 기자는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할 게 확실하다고 본다. 가르마펌처럼 돌고도는 유행 속에 언젠가 다시 ‘21세기 사이버 테크노’ 풍이 유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지금 창업하면 망한다는 것.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던 엑스재팬(X JAPAN). ‘비주얼 록’이라는 장르명이 말해주듯, 이들의 극도로 파격적이고 펑키한 외형은 단순한 콘셉트를 넘어 이들의 예술 그 자체였다.
이들의 활동 기간은 1982~1997년. 세기말인 1997년에 엑스재팬은 해체했다. 해체 뒤 솔로로 활동하던 엑스재팬의 상징인 기타리스트 히데는 1998년 안타깝게도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보다 세기말 감성에 걸맞은 서사, 그리고 비주얼을 가졌던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 기자는 ‘서태지와 아이들’ 정도만이 그나마 비교될 만한 대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는 좀 결이 다르지만 세기말을 휩쓸었던 주목할 만한 하나의 문화 사조가 있다.
바로 사이버펑크다.

◇사이버펑크 시대의 도래
1995년 공각기동대 개봉, 1997년 제5원소 개봉, 1999년 매트릭스 개봉. 그리고 대망의 2000년(원래는 2000년이야말로 20세기의 마지막 해다)엔 ‘요정 컴미’ 방영(?). 세기말의 대세는 사이버펑크였다.
컴퓨터라는 것이 막 보급되고 이용률이 급격히 늘던 90년대 말. 어쩐지 가까운 시일 내에 마주하게 될 것만 같은 사이버펑크의 세계였다. 초거대도시, 네온사인, 자동화된 차량, 첨단무기, 로봇, 가상현실… 수많은 사이버펑크라는 문화 사조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세기말 감성을 자극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아마도 퇴폐적이고 종말론적인 정서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펑크 콘셉트에 숟가락 얹기를 하는 마케팅이 종종 있었다. 위의 광고는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은 휠라의 의류 광고다. 기자는 이 광고를 암만 요모조모로 살펴봐도 그냥 스포티하고 까만 옷의 광고로 보이는데 광고에는 ‘사이버테크 콜렉션’이라고 돼 있다. 당대 메가 히트작이었던 영화 ‘매트릭스’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된다. 어느 시대 어떤 문화현상에나 이런 식으로 억지 숟가락 얹기를 하는 마케팅은 존재하는 법이다.
예상과는 달리 'Y2K 문제'는 사소하고도 우스운 해프닝 몇 가지만을 남기며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 버렸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의 때도 2000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1997년 7월에 공포의 대왕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국가에서는 기아그룹이라는 대기업이 부도를 맞는다. 공포의 대왕보다도 무섭게 기억되는 외환위기 사태의 서곡이었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망한다거나 전 세계적 멸망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우리는 왜 세기말에 열광했을까? 궁금해서였을 것이다. 한 해만 마무리돼도 '내년은 과연 어떨까?'가 궁금한데, 하물며 200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어땠겠는가! 새로운 천 년이 온다는 기대감. 과연 다가오는 천 년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선물할지에 대한 설렘. 우리의 우려대로 퇴폐적이고 종말적인 디스토피아가 찾아와 다시는 우리의 행복하고 밝은 세상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싶은 불안감.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들뜨고 걱정되는 마음이 우리의 세기말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이다.
잠시 짤막이 언급했지만 원래 2000년부터 21세기가 아니라, 21세기의 진짜 시작은 2001년부터다. 너무 많은 사람이 들뜨고 우려했던 탓일까? 진짜 새로운 밀레니엄인 2001년. 모두의 우려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긴 했지만, 어쨌든 세계 정세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한 대사건이 끝끝내 벌어지고야 말았다. 이 사건의 영향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2.jpg)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0.jpg)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256.jpg)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63.jpg)







![[정치대학]이재명, 정치운명 가를 ‘운명의 주’…시나리오별 파장은?](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294.jpg)
![[집땅지성] 그린벨트 해제 총정리…5년 뒤 청약 없으면 안 되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304.jpg)
![[찐코노미] 북미 시장 '이것' 쇼티지 심각해질 것…2차전지 톱픽은?](https://img.etoday.co.kr/crop/85/60/2098934.jpg)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https://img.etoday.co.kr/crop/85/60/2096914.jpg)
![[컬처콕 플러스] '아파트' 대박난 로제, 제니·리사와 다른 점은?](https://img.etoday.co.kr/crop/85/60/2099568.jpg)
![[정치대학] 박성민 "尹, 레임덕 아니라 데드덕…녹취 더 나올 것"](https://img.etoday.co.kr/crop/85/60/2098923.jpg)
![[집땅지성] "대출 규제, 서민만 잡는다"…디딤돌 대출 축소,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질까](https://img.etoday.co.kr/crop/85/60/2098890.jpg)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장고를 부탁해 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099738.jpg)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85/60/2099712.jpg)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85/60/2099221.jpg)
![[정치대학]이재명, 정치운명 가를 ‘운명의 주’…시나리오별 파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0294.jpg)
![사상 첫 8만1000달러 넘어선 비트코인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0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