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우려에서 현실로 바뀌면서 회원국의 분열 방지와 연합체 존속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하루 빨리 탈퇴 협상을 시작하길 원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은 새 총리 선임 때까지 미루길 원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은 협상 개시부터 탈퇴 이후 관계설정 등을 놓고 길고 쉽지 않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EU 회원국의 회의 일정이 잡혀있다. 25일에는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창립멤버인 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6개국 외무장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다. 26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28개 회원국 대사가 모여 정상회의를 준비한다.
주요 일정은 월요일인 27일에 몰렸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이탈리아 총리,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베를린에 초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유럽의 통합된 국방·안보전략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가 앞장서서 EU 개혁을 이끄는 ‘프·독 이니셔티브’가 논의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은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향후 절차를 논의한다.
28∼29일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참석하는 EU 정상회의가 열린다. 원래 23일 예정됐다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일정이 미뤄졌던 이 회의에서는 주로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숨 가쁜 일정을 잡아둔 EU의 가장 큰 바람은 영국을 빨리 떠나보내고 나머지 27개 회원국이 이탈하지 않도록 규합하는 것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영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EU 탈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캐머런 총리는 “새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시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탈퇴 협상을 후임 총리가 선출되는 10월까지 미룰 것을 시사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2년간 회원국과 EU가 맺어온 무역 등 관계 전반에 관해 새로운 협정을 맺는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2년이면 자동 탈퇴 처리된다. 탈퇴 국민투표 이후 리스본조약 50조를 이행해야 하는 시한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영국이 탈퇴 협상에 나서더라도 교역·관세·이동의 자유 등을 놓고 길고 복잡한 논의가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EU 회원국과 의회가 모든 결과를 승인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며 “영국으로서는 7년의 협정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브렉시트 이후 분담금 배분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은 EU 내에서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부담하는 국가다. 2014년 기준으로 영국의 분담금은 163억 파운드(약 27조원), 농업과 학술 분야에서 돌려받는 양여금을 제외한 순 분담금은 71억 파운드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자신들이 약 20억 파운드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610.jpg)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654.jpg)




![LG전자 ‘아웃도어 2종 세트’와 함께 떠난 가을 캠핑…스탠바이미고‧엑스붐고 [써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4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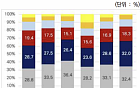



![[ENG/SUB]아일릿(ILLIT),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 #하이브 [컬처콕 플러스]](https://i.ytimg.com/vi/fjMTnFpQRW4/mqdefault.jpg)
![[아시아증시] 기업 실적부진 탓 일본증시 약세…닛케이 2.63%↓](https://img.etoday.co.kr/crop/85/60/2096679.jpg)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95915.jpg)
![비트코인 4%대 하락... 7만달러선 붕괴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9669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