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 나가 영어가 아닌 그 나라 현지어 간판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신생아들도 사물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물이 뭔지는 모른다. ‘엄마’ ‘아빠’ ‘맘마’라는 개념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다.
올해 5월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시작한 지 꼭 30년이 된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성가시고 짜증스러웠지만, 이제는 울음소리가 들려야 소아과 병원 맛이 날 정도다. 주사를 맞을 때처럼 당연히 울어야 할 때 안 울면 오히려 허전하다. 울다가도 엄마가 얼러주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금세 웃어버리는 모습에 난 매번 껌뻑 넘어간다. 아기들의 눈! 볼수록 아름답다. 티 하나 없이 해맑은 순수 그 자체,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 편안함,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눈빛. 웃을 때는 말한 것도 없고 울 때마저도 아름답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 같다는 말이 그래서 생기지 않았을까. 아가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계속 봐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착한 것으로 연결되니까. 그런데 살면서 때가 끼고 욕심이 생기며 맑음과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싶다.
최근에는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다. 진료실에서 아이 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살아갈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전염병, 에너지 문제, 주기적인 경제 불황, 정치사회적 갈등, 전쟁과 테러 등등이 날 그렇게 만든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한다. 세월에 쓸려 희미해진 눈동자,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념들이 주식전광판처럼 끝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가슴에는 사랑 대신 욕망으로 가득한 남자가 서 있다. 아가들의 눈을 보면서 워즈워드의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시구가 떠오르는 5월의 진료실이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LG전자 ‘아웃도어 2종 세트’와 함께 떠난 가을 캠핑…스탠바이미고‧엑스붐고 [써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4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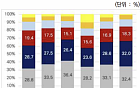
![尹지지율 19%, 취임 후 최저치...가장 큰 이유 “김여사” [한국갤럽]](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4752.jpg)




![2차전지 새로운 주도주 등장하나, 분야별 탑픽은 '이것' ㅣ 이창환 iM증권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iFpzTXCCMY/mqdefault.jpg)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85/60/2096610.jpg)






![[급등락주 짚어보기] 예스티, HPSP와 특허소송 패소에 하한가](https://img.etoday.co.kr/crop/85/60/2096631.jpg)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96610.jpg)
!['관광객 몸살' 북촌한옥마을 전국 첫 야간출입금지 시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965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