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인플레 일시적 입장 고수 전망
고용에 우선순위 두는 전략 변경 영향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5% 급등했다고 밝혔다. 2008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으로 시장 전망치(4.7%)도 웃돌았다. 근원 CPI도 3.8% 상승해 1992년 6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예견된 물가급등이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경제 재개가 맞물리면서 목재, 원유, 식품, 의류 등 모든 상품의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다.
4월 CPI 4.2% 상승에 이어 5월 소비자물가도 연준의 목표치 2%를 훨씬 상회한 만큼 연준이 정책 기조를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첫 조치로 현재 매달 1200억 달러(약 133조 원)에 달하는 자산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물가 급등이 당장 연준의 긴축 전환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연준이 “인플레는 공급망 병목현상과 억눌린 소비 폭발이 이례적으로 결합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연준은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2%를 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과거처럼 물가 급등 신호가 나타나자마자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압박이 순간적인 현상이라는 증거들이 있다”면서 “호텔 숙박료, 차량 렌탈비, 중고차 가격, 스포츠 관람료가 모두 코로나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연준의 시장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도 “인플레와 공급망 병목현상의 강도가 예상보다 크다”면서도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연준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물가 급등에도 연준이 긴축 전환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에는 고용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나 경제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기대만큼 호전되고 있지 않아서다.
5월 일자리 증가는 55만9000개로 예상치보다 10만 개 적었다. 4월 일자리 증가도 27만 개에 불과했다. 반면 실업률은 6%대를 유지하고 있다. 4월 채용공고가 930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채용은 608만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영향으로 사람들이 업무 복귀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랜드 쏜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앤 스웡크는 “모든 부문에서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사람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더 꺼릴 수밖에 없다”고 고용 시장을 평가했다.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 물가 외에 고용을 우선순위로 삼는 데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저물가 환경과 관련이 있다. 연준은 지난 수십년간 금리인상 및 인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린다는 판단 하에 인플레 조짐이 보이면 서둘러 긴축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오래 이어진 저물가로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8월 전략을 수정했다. 이후 고용 상황에 우선순위를 두고 물가가 목표치를 상회하더라도 완전 고용이 달성될 때까지 섣불리 긴축에 나서지 않는다는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연준이 자산매입 논의를 시작하고서도 실제 실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데이퍼링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실제 실행은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리인상은 이보다 훨씬 늦춰질 수 있다.
문제는 연준의 전망과 달리 인플레가 크고 지속적일 경우다. 이 상황에서 연준은 예상보다 빨리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게 되고 경착륙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연준 일부 인사들이 인플레가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610.jpg)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654.jpg)




![LG전자 ‘아웃도어 2종 세트’와 함께 떠난 가을 캠핑…스탠바이미고‧엑스붐고 [써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4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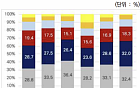



![[ENG/SUB]아일릿(ILLIT),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 #하이브 [컬처콕 플러스]](https://i.ytimg.com/vi/fjMTnFpQRW4/mqdefault.jpg)
![[종합] “고용 충격 없었다”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반등…나스닥 0.80%↑](https://img.etoday.co.kr/crop/85/60/2096770.jpg)
![[상보] 국제유가, 이란 보복 가능성에 상승…WTI 0.33%↑](https://img.etoday.co.kr/crop/85/60/2074035.jpg)
![[상보]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반등…다우 0.69%↑](https://img.etoday.co.kr/crop/85/60/2096169.jpg)

![[1보] 국제유가 상승…WTI 0.33%↑](https://img.etoday.co.kr/crop/85/60/2095986.jpg)

![[아시아증시] 기업 실적부진 탓 일본증시 약세…닛케이 2.63%↓](https://img.etoday.co.kr/crop/85/60/2096679.jpg)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95915.jpg)
![비트코인 4%대 하락... 7만달러선 붕괴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9669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