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여전히 경기 회복이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의 조사 결과, 지난해 주요 신흥국 30개국 중 3분의 2의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신흥국의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특히 이스라엘과 베트남, 체코 등 일부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역대 최고였다. 중국 외환보유액도 지난 2월말 기준 전월 대비 69억 늘어나 3조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사실상 8개월 만의 첫 증가세다. 중국의 1월 외환보유액은 2011년 2월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3조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이밖에 스위스와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외화 매입을 통해 자국 통화 절상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최근 위안화 가치를 지지하고 외환보유액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처럼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갑작스런 시장 충격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선진국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을 늘렸다고 WSJ는 설명했다. 웨스턴자산관리의 치아량리안 이머징채권부 대표는 “외환보유액은 국가 위기와 디폴트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해 상당수 국가의 외환보유액 가치도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늘리기는 최근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 회복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정치적·경제적인 불안정으로 글로벌 자본과 무역 흐름이 깨져버리면 세계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 다시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이다. 지난해 초 달러와 미국 국채의 강세로 이머징 자산이 대거 매도되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되면 금리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610.jpg)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654.jpg)




![LG전자 ‘아웃도어 2종 세트’와 함께 떠난 가을 캠핑…스탠바이미고‧엑스붐고 [써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4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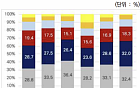



![[ENG/SUB]아일릿(ILLIT),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 #하이브 [컬처콕 플러스]](https://i.ytimg.com/vi/fjMTnFpQRW4/mqdefault.jpg)
![[아시아증시] 기업 실적부진 탓 일본증시 약세…닛케이 2.63%↓](https://img.etoday.co.kr/crop/85/60/2096679.jpg)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95915.jpg)
![비트코인 4%대 하락... 7만달러선 붕괴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9669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