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확장적 재정운용(총지출 증가율 5.7% vs 5년 평균 5.0%)이다.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고,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어 민간부문의 활력을 되살려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 균형의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좋은 취지지만 너무 커져 버린 ‘나랏빚’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나랏빚에 대한 걱정은 역대 정부도 자유롭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9.3조원의 국가 채무를 안고 시작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73.5조원 증가된 133.8조원 국가채무를 넘겨준다.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65.4조원 증가된 299.2조원의 채무를 넘겨주었다. MB는 5년 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143.9조원 증가된 443.1조원의 장부를 넘겨주었다. 그때마다 야당의 공격은 거셌고 학계, 언론계 모두 걱정했다.
박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집권 2년 만에 국가채무 장부에 127조원 늘어난 570.1조원을 써내면서 GDP의 35.7% 수준에 이르는 빚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던 2009년(35.6%)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다시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국가채무가 쌓여 가는 속도도 PIGS 전체보다 3배나 빠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영향으로 단년도의 수지인 관리대상재정수지(이하 재정수지) 적자도 △33.6조원, GDP 대비 △2.7%로 2010년(재정수지 적자 △30.1조원, GDP 대비 △2.7%) 이후 5년 만에 가장 악화되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314.2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을 넘겼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나랏빚에는 반드시 상대적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은 109.5%다. 우리나라의 3배를 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순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OECD(△4.6%)의 3분의 2 수준으로 금세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수준이었을 때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율도 독일(1992년) 42%, 영국(1998년) 45.8%, 프랑스(2003년) 55.4%, 미국(1992년) 68.2% 등으로 모두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건전재정은 아니지만 국제적 비교와 선진국의 선례를 조면 부실재정이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다음달 국회에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걱정의 목소리는 모두 쏟아내고, 하나하나 짚어보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약속(예산안 처리시한)은 꼭 지켜내야 걱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고, 장부에 머물러 있던 돈이 조기에 풀려서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세금이 잘 걷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고, 내년도 결산 땐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 있는 우리 경제를 기대해 본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610.jpg)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654.jpg)




![LG전자 ‘아웃도어 2종 세트’와 함께 떠난 가을 캠핑…스탠바이미고‧엑스붐고 [써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4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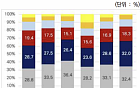



![2차전지 새로운 주도주 등장하나, 분야별 탑픽은 '이것' ㅣ 이창환 iM증권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iFpzTXCCMY/mqdefault.jpg)








![[오늘의 주요공시] 에코프로, 3분기 영업손실 1087억…전년比 적자전환](https://img.etoday.co.kr/crop/85/60/2096708.jpg)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95915.jpg)
![비트코인 4%대 하락... 7만달러선 붕괴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9669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