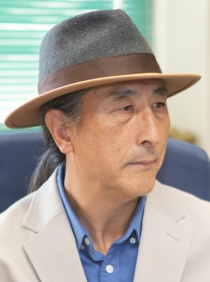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위상을 행사하고 자존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바로 권리와 의무다. 의무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높은 경지가 ‘국방의 의무’다. 국가와 국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다. 한 사람이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한 사태 속에서 생명을 잃은 경우 전사자가 된다.
민간에서라면 통념적으로 사망과 함께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은 이미 종지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전사자의 귀환은, 그리고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되고 장례식을 치르는 일련의 여정은 그의 삶 못지않게 장중한 한 편의 드라마로 펼쳐질 수 있다. 전사자의 희생을 숭고한 가치로 받들고, 가족에게 인도되기까지 모든 예우를 갖춰 시신의 존엄을 곡진(曲盡)히 지켜갈 수 있느냐는 한 나라의 성숙도와 국격을 현시하는 잣대가 아닐까 싶다.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로스 캐츠 감독, 2009)은 이라크 전쟁에서 2004년 전사한 미군 해병 ‘챈스 펠프스 일병’의 유해를 고향으로 운구한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라크전에 참전한 미군 사상자가 2004년 들어 급증하는 가운데, 스트로블 중령은 버지니아의 해병 사령부에서 전황과 전략분석 일을 맡고 있었다.
위험한 전쟁터를 젊은 병사들에 맡긴 채 자신은 안전한 본국에 남아있다는 것에 당시 그는 큰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그때 새로운 전사자 명단 중에서 열아홉 살의 챈스 펠프스 일병이 동향인 와이오밍 출신임을 발견하고 그의 유해를 유족에게 운구하는 임무에 자원한다. 영관장교가 사병의 유해를 운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글로 기록해 두었다가 신문에 게재했고 큰 반향을 얻었다. 그것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운구 도중에서 만난 다양한 계층의 미국 시민들 모두 전사자의 명복을 빌며 전쟁 영웅으로 진정 어린 예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은 자신의 임무가 함의하는 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를 기억하며 그 희생의 무게를 가늠해보는 것, 그의 삶과 영웅적 죽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먼저 간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는 깊이 자각한다.
이 영화를 보면 미국이 왜 위대한 나라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영화에서처럼 미국은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자의 유가족에게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전사 통지서를 담당 장교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다. 그리고 시신 운구부터 장례까지 모든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곡진하게 진행한다. 전사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는 전사 통지서가 유가족에게 전달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최고의 예우와 곡진한 존경이 담긴 국가 차원의 성대한 행사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제야 우리나라도 제대로 격식을 갖춰 독립 영웅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2년 후,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예우나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쯤에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홍범도 장군과 그 유가족들에게 ‘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528.jpg)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2.jpg)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0.jpg)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256.jpg)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63.jpg)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72.jpg)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348.jpg)









![[상보] 일본 이시바, 중의원 결선투표 끝에 총리 재선출](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667.jpg)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0528.jpg)
![코스피 1% 이상 하락... 2531.66에 마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06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