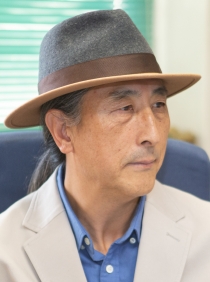
이 영화의 원작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 ‘라쇼몽’(1915)과 ‘덤불 속’(1921)이다. 라쇼몽(羅生門)은 일본 헤이안 시대 수도였던 교토의 성문 이름이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원작들의 의도, 정서와 주제를 지혜롭게 계승하면서 하나로 통합해 한층 더 명료하고 고양
된 서사를 완성해냈다. 1951년 제15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과 제24회 아카데미상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며, 패전으로 구겨진 일본의 문화적 자존심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 속 사건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압축될 정도로 너무나 간단명료하다. ‘사무라이와 아내가 산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나게 됐으며, 산적은 사무라이의 아내를 겁탈했고, 사무라이는 죽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무라이의 죽음이 자살인가 타살인가를 두고, 사건의 세 당사자와 한 명의 목격자 진술이 모두 다르다는 데 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쇠락해 무너져가는 라쇼몽 처마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는 나무꾼과 승려에게 한 남자(주인 집에서 쫓겨난 하인)가 합류하는 도입부. 그리고 이제는 비가 그친 라쇼몽에서의 결말부가 이야기의 바깥 테두리, 즉 액자를 구성하고 있다. 그 내부의 본 이야기는 관아에서 사건 관련 진술을 하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과 당시의 사건 재현(플래시백)으로 채워져 있다. 감독은 관객을 판관(判官)의 자리로 초대한다.
인물들 각자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과 위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고 윤색하기 위해, 사법적 징벌이나 곤란한 상황 모면을 위해,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상황을 조작하거나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감춘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각자의 진실’이다.
인물들의 각기 다른 입장, 즉 서로 다른 양심과 아집은 세상 모든 논란과 다툼의 근원이고 핵심이다. 그런데 마지막 반전은 나무꾼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는 액자식 구성의 바깥에서,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목격자로서 팩트만을 진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값나가는 단도를 훔친 정황이 탄로나며 그의 진술 역시 거짓임이 드러난다. 영화는 결국 사무라이의 죽음이라는 핵심 사건의 실체(자살·타살)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생히 통찰하고 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 정직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윤색을 한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기주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악의 핵심이다.”
인간은 정녕 구제불능이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영화의 엔딩에서는 유일한 대안을 제시한다. 역설적이게도 그 방법은 인간애정과 신뢰에 있음을 설파한다. 아기를 안고 걸어가는 나무꾼의 밝은 표정과 옅은 미소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개과천선한 인간의 선한 의지 회복으로 읽어내지 않는다면 너무 슬프고 비참하지 않겠는가.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는 온갖 첨예한 대립과 갈등, 이해 충돌을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은 ‘우리는 이전보다 무엇 하나라도 나아지고 있는가, 우리는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사회구성원 각자의 서로 다른 양심과 가치관과 아집을 두루 관통해 평정할 만한 교양과 보편 상식의 획득, 역지사지의 성찰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도 멀고 험난하다.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2.jpg)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0.jpg)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256.jpg)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63.jpg)







![오세훈 서울시장, 제7회 AI·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458.jpg)
![[특징주] 제노코, 한국항공우주 경영권 피인수 소식에 연일 상승세](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386.jpg)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99872.jpg)



![[정치대학]이재명, 정치운명 가를 ‘운명의 주’…시나리오별 파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0294.jpg)
![오세훈 서울시장, 제7회 AI·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04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