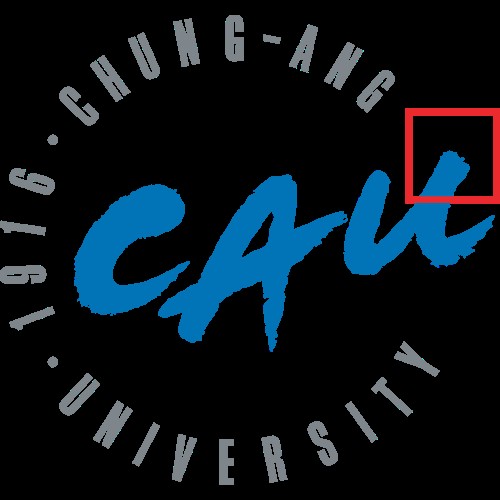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표절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연구비 지원 혜택 등에서 배제된 중앙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A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연구윤리 위반 판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는 2007년 12월 B 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교신저자로 등재됐다. 교신저자란 연구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개 전임 교수들이 맡는다. 하지만 B 씨는 해당 논문을 쓰면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해 송사에 휘말려 5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중앙대 연구윤리위원회는 “A 교수가 직접 표절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으나 표절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신저자의 역할 수행이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 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통보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판정에 A 교수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배척했다. 결국 A 교수는 중앙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 측은 “중앙대가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이유로 원고의 교내연구비, 논문지원금 지급과 연구조교 및 연구년 신청을 모두 거절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학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고, 학계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윤리 위반 판정에 대해서도 “연구주제 및 해석에 관한 논의 참여, 논문 출판을 위한 저널 선정, 심사자 코멘트에 따른 수정‧보완 등 교신저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당시의 논문 작성 및 검증 체계 하에서는 B 씨의 논문 표절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교신저자의 역할 수행이 미진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연구윤리 위반 판정은 무효”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교수가 B 씨의 논문 작성 자료 획득 및 분석 등에 최소한의 기여만 했더라도 이와 같은 표절 사실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며 “A 교수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 기여를 하거나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 교수는 논문 작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소송 과정에서도 교신저자의 역할 중 어떤 일을 했는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A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연구윤리 위반 판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A 교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528.jpg)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2.jpg)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0.jpg)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256.jpg)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63.jpg)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72.jpg)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348.jpg)







![[종합] 서울 하늘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내년 UAM 실증 돌입](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523.jpg)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0528.jpg)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057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