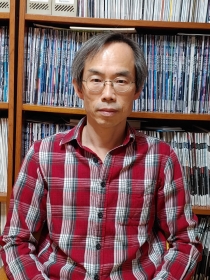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개를 특별대우하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다. 영장류라면 모를까 소나 돼지에 비해 개가 사람에 더 가까운 것도 아니고 지능이 더 높지도 않다. 그럼에도 일부 채식주의자를 빼고는 소와 돼지를 잡아먹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개를 먹었던 과거 우리가 더 합리적이었던 것 아닐까.
2000년대 들어 야생동물 가축화에 대한 고고학 발굴 및 유전체학 연구가 이어지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늑대를 길들여 개로 만든 사건이 무려 3만 년 전 일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소와 돼지 같은 주요 가축을 길들인 건 1만 년 전이다. 당시 수렵채취인들이 개를 키운 목적은 고기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사냥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다. 오늘날 수렵채취인 사회를 관찰한 결과 개를 동반한 사냥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인류가 농업사회를 이루며 개의 역할이 다양해졌고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반려동물로서 사람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개를 특별대우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3만 년에 걸쳐 개와 사람이 동고동락하면서 둘의 게놈도 같은 방향으로 진화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으며 탄수화물(녹말) 섭취 비율이 늘어나면서 사람 게놈에서 이를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레이스의 유전자 개수가 늘어났는데, 음식 찌꺼기를 받아먹던 개 역시 아밀레이스 유전자가 늘었다. 참고로 늑대는 육식동물이다.
인류는 늑대를 개로 길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백 가지 품종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개의 생김새와 체형이 제각각이지만 무엇보다도 덩치 차이가 두드러진다. 사람도 피그미족과 북유럽인을 비교하면 덩치가 꽤 차이가 나지만 개에는 비교가 안 된다. 치와와 같은 소형견과 세인트버나드 같은 대형견의 몸무게 차이는 40배에 이른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은 개 200여 품종의 게놈을 분석해 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 20여 개를 찾아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해 이런 큰 차이를 낳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 다만 인슐린유사성장인자1(IGF1) 관련 유전자의 변이가 15% 정도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견 크기인 늑대에서 개가 나왔으므로 소형견은 IGF1 수치를 낮게 만드는 변이가 선택된 결과일 것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IGF1 수치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변이를 찾았다. IGF1의 양을 조절하는 IGF1-AS 유전자로 T형과 C형이 있다. 몸무게가 25㎏ 넘는 품종은 주로 T형이고 15㎏ 미만인 품종은 주로 C형이었다. 개의 조상인 늑대 수십 개체의 게놈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거의 T형이었다. 가축화 초기 사냥 파트너였던 개 역시 비슷했을 것이다. 그런데 개를 반려동물로 삼으면서 작은 개를 선호해 C형이 점점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IGF1-AS 유전자는 T형이 원조일까.
연구자들은 수만~수천 년 전 늑대와 개(발굴한 뼈) 게놈뿐 아니라 여우와 코요테 등 다른 갯과 동물의 게놈도 비교했다. 그 결과 수만 년 전 늑대 역시 C형의 비율은 낮았지만 지금보다는 높았고, 다른 갯과 동물들은 거의 C형이었다. 여우와 재칼, 코요테는 덩치가 작으므로 말이 된다. 결국 갯과 동물의 조상은 C형이었고 약 1000만 년 전 늑대 계열이 분화한 뒤 변이가 일어나 T형이 나왔고 덩치가 점점 큰 쪽으로 진화해 오늘날에는 거의 T형으로 바뀐 것이다.
즉 수백만 년에 걸쳐 C형 우세에서 T형 우세로 바뀐 늑대를 길들인 사람이 불과 수백 년 사이 T형 우세인 대형견에서 C형 우세인 소형견을 만들며 유전자의 원형을 되찾았다. 늑대는 개의 조상이지만 IGF1-AS 유전자만 보면 오히려 개(소형견)가 늑대의 조상인 셈이다.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528.jpg)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2.jpg)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020.jpg)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0256.jpg)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63.jpg)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872.jpg)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9348.jpg)










![[종합] 한화손보, 여성보험 필두로 3분기 순이익 3500억 육박](https://img.etoday.co.kr/crop/85/60/2099151.jpg)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0528.jpg)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057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