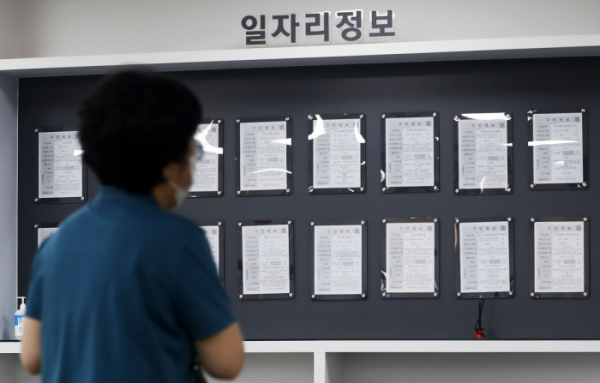
지난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의 여파에도 지난달 취업자가 51만8000명 증가하며 '선방'한 데는 이같은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이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60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1000명(7.4%) 늘어났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약 3시간에 불과하며, 월 단위로 보면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조사 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며 "8월 조사 대상 주간에 대체공휴일(8월 16일)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간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적게 집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3월(154만4000명) 처음으로 15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줄곧 150만 명대를 상회했고, 5개월 만에 16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대체공휴일의 영향이 있더라도 최근 증가세임을 고려하면 초단시간 근로자 절대 수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소위 '일자리 쪼개기'와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의 증가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등이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초단시간 근로자 중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포진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종사자를 합친 비중은 35.2%에 달한다. 65세 이상의 비중도 40.6%로 10명 중 4명꼴에 달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대부분(63.5%)이었으며, 직종별로 보면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종사자(38.0%)가 많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들도 포함돼 있어 이를 적용하면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515.jpg)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156.jpg)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1671.jpg)



















![[찐코노미] 美 취약점을 파고든 K방산의 미래…차기 방산 대장주는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1653.jpg)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첫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1714.jpg)